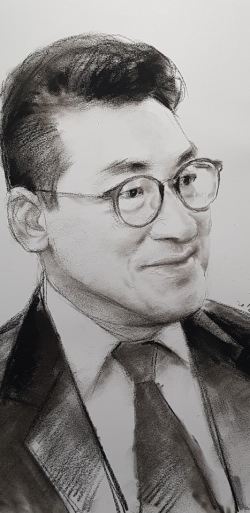
‘존경받는다’와 ‘멸시받는다’.
한 대상에 대한 극과 극의 표현이다.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지극한 화려함과 차마 볼 수 없는 추함의 차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 차이가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연탄재다.
한 겨울, 아궁이에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올라 사람들의 요구대로 삶을 마감한 뒤 미처 그 기운이 식기도 전에 골목길로 내버려진다. 이내 차가운 폐기물로 전락하여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뭇 사람들의 침뱉는 장소나 담뱃재 버리는 재떨이로 전락한다.
살아있을 때 600도의 이글이글한 온도에서 불꽃같은 삶을 살다가 누구도 봐주지 않는 영하의 차가운 신세가 된다. 어쩔 때는 이름모를 나그네에게, 어쩔 때는 그를 애용하던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 장렬히 산화하는 비극을 맞기도 한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연탄재를 노래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싶은 것이다...<중략>
시인의 발상이 참으로 위대하다. 연탄재 한 장을 두고 연극처럼 열기와 냉기를 스미게 만든다. 시인은 겨울밤 잠 못 이뤄 뒤척이는 처절한 몸부림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안도현 시인이 해직교사 시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곱씹으며 지었다는 시다. 그때 냉엄한 현실 속에서 발견한 차가운 연탄재, 자기 몸을 불사르며 방을 데워주고 라면을 끓여주며 마지막에는 재가되어 버림받는 그 신세를 발견했던 탓이리라.
지금은 우리 삶에서 사라진 연탄. 그 이름은 원래 19공탄이었다. 훨훨 타올라 세상 모든 것을 펄펄 끓이고, 태울만큼 태우다 가라는 주문이 들어있다. 한번이지만 남을 위해 뜨거운 삶으로 살다 가라는 지엄한 명령이 들어있다.
그것은 이타적(利他的) 삶으로 생을 마감한 우리 어머니의 삶이기도 했다.
그 속에는 고난의 거친 풍파를 견뎌낸 어머니의 주름살도 있었고 주렁주렁 달린 새끼들의 웃음도 묻어있었다. 그러다가 연탄재가 골목에서 치워질 때면 어느덧 개나리가 피어난 새봄이 되곤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도 다음 세대로 고개를 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탄재는 우리들의 불꽃같은 청춘의 상징이다.
부스러지는 껍데기만 남는 연탄재였지만 그 덕분에 겨울도 있었다.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이라고 했다.
인생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 뜬 구름의 사라짐이다.
대명절인 설날이 가까워 온다.
골목길 연탄재라도 발로 차지 말자고 세상에 주문한다. 버려지기 전에는 그토록 소중했으니까. 버려진 연탄재를 소중히 생각하듯 내 주변에 한 톨의 소홀함이 없기를 다짐해본다.
인연으로 사는 삶, 세상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