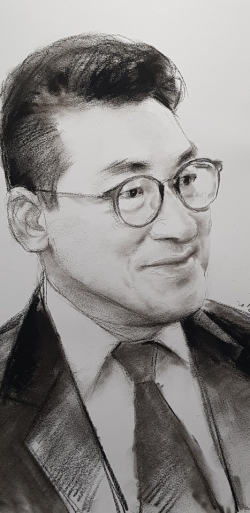
우리말에 단 한 글자로 모든 것을 용서하며 기쁨을 주고 감정의 극치를 달리는 단어가 있다.
‘꽃’이다.
세상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말이 더 있으랴.
꽃은 어쩌면 말 그 자체도 필요 없는, 그저 한 송이면 모든 것이 녹아들게 하는 마법의 상자다.
꽃 한 송이에는 작은 씨앗에서 발아한 태고의 영원성과 생명을 향해 끝없이 꿈틀거리는 야생의 숨결이 깃들어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비로움과 광활한 우주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는 감히 인간이 넘보기 어려운 신의 영역이다.
꽃은 누가 피어나라고 해서 피지 않는다.
누구에게 보아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환희와 용서와 희망을 준다. 꽃은 큰 꽃이건 작은 안개꽃이건 모양을 가리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화사하게 정원을 가득 수놓은 꽃은 형제가 많아서 예쁘지만 찬 이슬 맞고 지리산 비탈길에 외롭게 핀 꽃은 홀로여서 더 예쁘다.
시인 고은 선생은 ‘그 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인생과 꽃을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 올 때 못 본/ 그 꽃”
꽃 한 송이를 늦게 발견한 시인은 단 세 줄로 된 이 시에서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오직 정상만을 생각하며 오르고 또 오르던 고단한 삶을 돌이켜 보게 한다.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것에도 신경 쓰는 여유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데, 고된 삶을 굽이굽이 돌아오며 켜켜이 쌓아 놓고 보니 이제야 ‘나’라는 꽃이 보이더라는 회상이다. 시인의 머리에는 이미 흰머리가 서렸고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 먼 곳까지 와버렸음을 감지한다.
그런가 하면 조동화 시인은 무리지어 핀 꽃의 장엄함을 이렇게 노래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시인은 불꽃같은 야생화 군락을 배경으로 삼았다. 생명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꽃동산을 만들고 있다. 지리산 바래봉을 시뻘겋게 물들인 철쭉을 연상케 한다. 하나로는 부족하지만 하나 둘이 모여 ‘위대한 우리’를 이룰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작은 꽃 한 송이가 화합과 기쁨의 천국을 만들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황룡강으로 돌아가 보자.
축제가 시작되니 황룡강이 모처럼 형형색색 꽃 전시장으로 변했다. 그동안 코로나에 시달린 주민들의 표정에 웃음꽃도 만발했다. 즐겁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왜 이런 꽃밭을 이제야 보여주느냐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꽃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꽃밭 관리가 엉망이라는 점이다. 군데군데 머리 빠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책임감 부족과 관리소홀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꽃은 애정과 과학의 산물임을 몰랐을 리 없다. 같은 지역에 심었고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째 이리도 과거와 차이난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리라 믿는다.
두 번째는 황룡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4계절 꽃구경할 수 있는 관광 명품으로 만들 생각을 왜 안하느냐는 반문이다. 그렇잖아도 장성군에는 볼거리라고는 백양사와 장성댐 등이 고작인 상황에서 작은 투자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도 보탬이 되는 발상의 전환을 꿈꾸는 게 망상일까. 가까운 담양군은 허허로운 논밭을 갈아엎고 메타프로방스를 만들어 이색 명소로 만들었다. 더 이상의 각성제가 또 필요할까?
황룡강을 슬프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