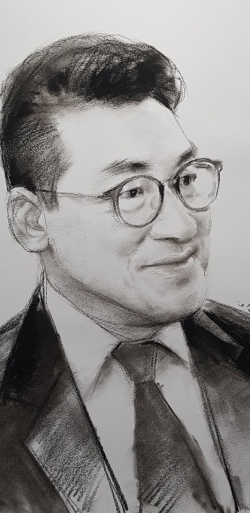
인류 역사는 평화기보다는 혼돈기가 더 길다는 느낌을 준다. 혼돈기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유독 많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영웅들은 혼돈의 시기에 출현했고 군웅할거의 전장에서 살아남아 전설을 만들어 냈다. 대부분은 새 시대를 개창한 국조(國祖)들이 그러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동시대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권력의 정점에 있든 변방에 있든, 어느 한쪽 편에 서기를 강요받게 된다.
이 때 영특한 사람들은 시대의 대세론을 따라 밝은 쪽 편에 서기를 주저치 않는다. 잽싸게 시류에 편승한다. 그들은 밝은 양지를 즐기고 밤이 오지 않기를 소망한다. 때로는 그들의 축제장을 밝히는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대로 올곧은 기개를 가진 사람들은 대로를 버리고 가시밭길을 고집한다. 언제 대로를 만날 지도 모르면서도, 언젠가는 바른 길이 나올 것을 믿고 길을 간다.
멀지 않는 시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의 선택을 보면 이해가 간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실제 한일합병의 기간일 뿐 일제침략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청일전쟁(1894)과 을미사변(1895)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상의 일제강점기는 이 때부터였다. 그러니 1895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를 계산하면 무려 50년 동안이 사실상의 일제강점기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 침탈의 가면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조선 사람을 당근과 채찍으로 유혹했다. 일제에 협조한 사람들에게는 사업권을 나눠주고 무슨 일이든 편의를 봐주며 달콤한 밀어를 나눈다. 협조한 사람들 역시 맛있는 당근의 시대가 오래 가기를 기원하며 더욱 밀착 협조했다. 그들은 일제 같은 강대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간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 내부에 친일 내각 만들기를 시도한다. 그 수단의 하나가 조선인에게 펼치는 당근 작전이었다. 시대를 좀 읽을 줄 안다는 식자층을 포섭하여 ‘앞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올 것이며 조선은 이 대세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속삭인다. 그러면서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고위직 관리나 돈이 되는 사업권을 주었다.
이같은 협조자들의 아첨 덕택에 조선 조정에는 친일세력이 깊숙이 침투했다. 그러니 아무리 탄탄한 궁궐이라도 안 무너지고 견딜 재간이 있겠는가?
일제는 청일전쟁 직후 조선을 본격적으로 손아귀에 넣고 싶었으나 민비(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아예 민비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른바 민비 시해사건이다. 국모인 민비는 일본이 고용한 자객들에 의해 가슴에 칼을 맞고 시해당한 뒤 시신이 궁궐 숲속에서 불태워진다.
이 사건은 대일본제국을 건설하는데 당근(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채찍(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협조자에겐 부귀영화를, 협조하지 않는 자에겐 무자비한 피의 복수가 있다고 보여준다.
1905년 한일을사조약 체결로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될 때도 당근에 물든 매국노들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다. 당근의 달콤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독립이란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해바라기 근성들 때문에...
하지만 해는 정의의 편인 동쪽에서 뜬다.
역사의 윤회를 보면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피를 끓게 한다.
홍범도는 극한의 만주·연해주 벌판에서 일평생 독립운동하다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 사막지대로 추방되어 해방 직전인 1943년 눈을 감은 영웅이다. 우리는 이렇게 몇 줄의 문장으로 그의 영웅성을 기리지만 혹독한 동토의 역경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는가.
그런 홍범도 장군도 남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편에 서야만 했다. 조직과 힘에 한계가 있는 무장 세력을 이끌고 긴 투쟁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수천 명의 독립운동세력을 유지하고 나라 없는 설움을 극복하려면 일단은 몸을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이란 두 글자였다.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가치도 염두에 둔 바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동토의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와 70여 년 만에 조국 땅에 묻힌 영웅의 시신을 다시 파헤치려 한다.
반공이념에 젖은 이 나라 대통령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 정의의 편인가 아니면 권력의 편인가.


